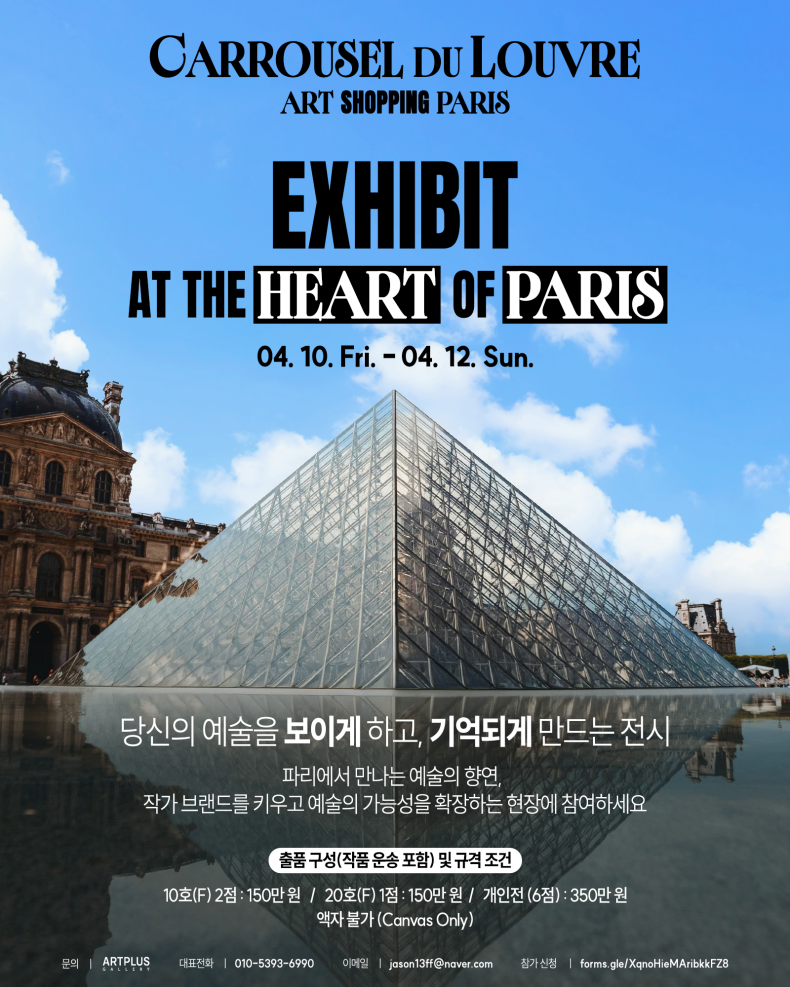문화저널코리아 김영일 기자 | 옥은 예로부터 신성한 보석으로 여겨져,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다양한 의미와 상징을 품어왔다. 왕의 권위를 나타내기도 했으며,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했다.
문화저널코리아 김영일 기자 | 옥은 예로부터 신성한 보석으로 여겨져,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다양한 의미와 상징을 품어왔다. 왕의 권위를 나타내기도 했으며,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했다.
"군자는 반드시 옥을 찬다(君子必佩玉)"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옥은 순결과 온유함, 고귀함의 상징으로 오랜 세월 사랑받아왔다. 조선 세종대왕 시기, 조선 최고의 궁중 음악가이자 '삼대 악성' 중 한 사람인 박연은 ‘남양옥(南陽玉, 궁중옥)’을 처음 발견해 전한 이와 인연을 맺는다.
그 인물은 바로 ‘서하’라는 사람이었다. 당시 임금의 식사를 책임지던 '식의(食醫)'였던 서하는, 남양옥의 맑고 청아한 소리를 박연에게 전해주었다. 박연은 그 소리에 깊이 감동해 세종대왕께 이를 알렸고, 곧 옥으로 악기를 제작하라는 명을 받는다.
그로부터 600여 년이 흐른 후, ‘서하’의 직계 후손인 서지민 교수(서울산업대 명예교수)가 다시 ‘궁중옥’과 운명처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마도 피할 수 없는 필연이었을 것이다. 6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궁중옥은 결국 서하의 후손에게 운명처럼 찾아왔다.

서지민 교수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집을 팔아 옥 광산을 구입하는 등 숱한 고난을 겪었지만, 우리 전통을 향한 그녀의 집념은 흔들림이 없었다. 수십 년간 전통 궁중옥을 연구하고 지켜온 서지민 교수는, 이제 이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그녀의 옥에 대한 사랑은 연구로만 끝나지 않았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모승을 더욱 단아하게 만들었던 옥비녀와 옥가락지를 유독 좋아했던 소녀는, 시간이 흘러 숙녀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옥에 매혹되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대학에서 많은 제자를 길러내며, 한편으로는 옥 공예가로도 왕성히 활동했다.
그리고 또 세월은 흘렀다.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고... 겨울이 되어 눈이 내리고 다시 봄이 찾아왔다.
계절은 강물처럼 흐르고, 시간은 쉼 없이 흘렀다.

이제 서지민 교수의 시계는 90년을 가리키고 있다. 궁중옥과 함께한 시간은 어느덧 한 세기에 다다르고, 2025년의 오늘, 세상은 인공지능(AI)이 전쟁까지 대신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 급변하는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보석 중 하나이자 왕실의 보석인 '궁중옥'을 지키며 살아온 그녀의 인생은 더욱 깊은 울림을 준다.
인(因)이 없으면 과(果)도 없고, 인이 없으면 연(緣)도 없다. 그리고, 역사가 없다면 미래도 있을 수 없다. 어쩌면 이번 전시는 서지민 교수 인생의 마지막 전시가 될지도 모른다. 시간을 빚어낸 왕실의 보석, 그리고 왕실의 보석으로 빚어낸 시간. 그 모든 여정이 담긴 이번 전시에, 우리는 한 인간의 90년 인생이 세워낸 찬란한 역사 앞에 깊은 경탄과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바라본다. 서지민 교수의 시계가 100년을 가리키는 날, 다시 한번 '왕실의 보석전'을 만날 수 있기를. [ 글. 정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