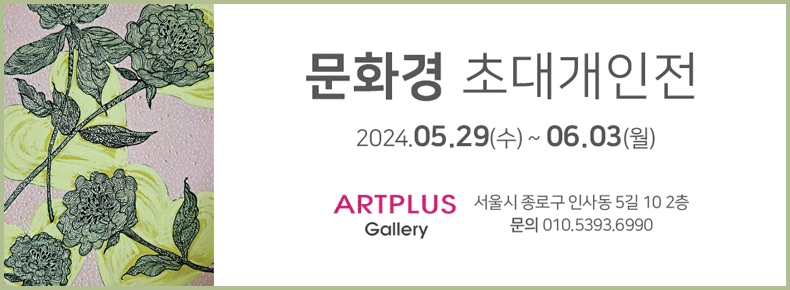문화저널코리아 오형석 기자 |  국가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왕래를 할 수 있는 21세기 그리고 그렇지 못한 남북한 이산가족.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의 모습과 상반된다. 그들의 이별과 헤어짐은 잊히는 역사 속 한 구절로 방치되어 있는데,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매스컴을 통해 수많은 난민과 가족을 잃는 모습을 접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산가족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냈다.
국가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왕래를 할 수 있는 21세기 그리고 그렇지 못한 남북한 이산가족.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의 모습과 상반된다. 그들의 이별과 헤어짐은 잊히는 역사 속 한 구절로 방치되어 있는데,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매스컴을 통해 수많은 난민과 가족을 잃는 모습을 접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산가족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냈다.
<내가 이산가족이라면 어떨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이 주제는 현실의 문제점만 바라보는 정치·경제·이념의 차이 대신,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이산가족의 이야기를 인간적으로 접근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표현한다. 따라서 이산가족의 헤어짐이 외부에 의한 것임을 주목하여 단절된 그들의 상황을 보여주고자 <메아리>로 연결지었다. 메아리는 사전적 의미로 울려 퍼진 소리가 산 같은 장애물에 의해 부딪혀 되울려 오는 소리로, 이를 회화와 설치 그리고 영상으로 전시한다.
회화에는 공통으로 둘로 나뉘며 대칭되는 선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의미하며 그 주변으로 이산가족의 메아리처럼 표현된 편지들은 건너가지 못한 채 주변을 맴도는 것을 보여다. 봄·여름·가을·겨울의 시간과 남과 북을 가로막는 산과 바다를 표현한 색들은 복합적인 의미를 담아내며, 검은색은 과거 이산가족의 짧은 만남의 기록을 설명한다.
설치는 기계장치가 설치된 키네틱 아트로, 알루미늄판 좌우에 놓인 철지들이 중앙까지 모이다가 넘어가지 못하고 되돌아오도록 설정했습니다. 움직임에 제한을 주도록 자석을 기계장치에 부착했으며, 철지는 전쟁의 흔적이자 이산가족을 의미한다.

퍼포먼스로 제작된 영상은, 등장인물이 편지를 적는 것으로 시작한다. 편지를 적고 그것을 비행기로 접어서 건너편으로 날리는데 그 편지는 다시 돌아옵니다. 종이비행기를 줍고 날리기를 반복하다가 그것은 보이지 않는 응어리로 대체해 표현되는데, 점점 응어리는 커지고 마지막 부분에는 들 수 없는 형태로 바뀐다. 건너편에 무언가 막힌 것처럼 되돌아오는 응어리에 좌절해 주저앉지만 그런데도 가족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놓지 못하고 건너편을 바라보며 끝나는 영상이다. 이 영상은 2019년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에 위치한 디에프 작업실에서 제작됐으며, 2024년 소리를 삽입해 재제작됐다.
잊혀가는 것에 대해 다시 드러냄으로써 작품을 관람하는 관객과 함께 우리가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에 대한 방향성과 공감을 가지고, 이산가족에게는 위로하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 작가노트
2016년부터 쌍둥이 듀오 작가로서 아이디어부터 실현까지 단계적으로 함께 작업하는 ARONGDARONG은 개념을 내포한 기호들을 점, 선, 면, 도형의 공간으로 이미지를 풀어내고 질서정연하게 표현했다.
공동으로 작업한 다양한 시리즈의 프로젝트들은 보편적인 인간의 삶부터 내면 탐구, 감정, 태도, 자아까지 폭넓은 주제들을 단순한 형태로 나타내며 무한으로 확장되는 서사로 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표적으로 정사면체(삼각형) 시리즈에서는 다양한 면모를 가진 인간의 자아를, 육면체(사각형) 시리즈에서는 상상과 현실 공간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주체자로서의 인간을 그리고 구(원형) 시리즈에서는 인간의 반복되는 행위와 반성을 도형적 기호로 전달한다.
평면에서 벗어나 3차원 공간의 입체도형으로 재배열하는 형태적 특성은 어떤 일과 대상이 존재하거나 일어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직접 드러내는 적극적인 태도보다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도형에 빗대어 함축적으로 묘사하는 의미전달이다. 이처럼 부연하지 않은 입체도형 작품을 바라보는 이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도형 속에 감춰진 감각과 감정을 느끼며 작가와 작품 그리고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저마다 유추한 결론을 맺음으로 보는 이가(관객) 작가의 의도를 해석하기보다는 관객의 생각과 환경에 따라 작품을 다르게 해석하고 감상하도록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