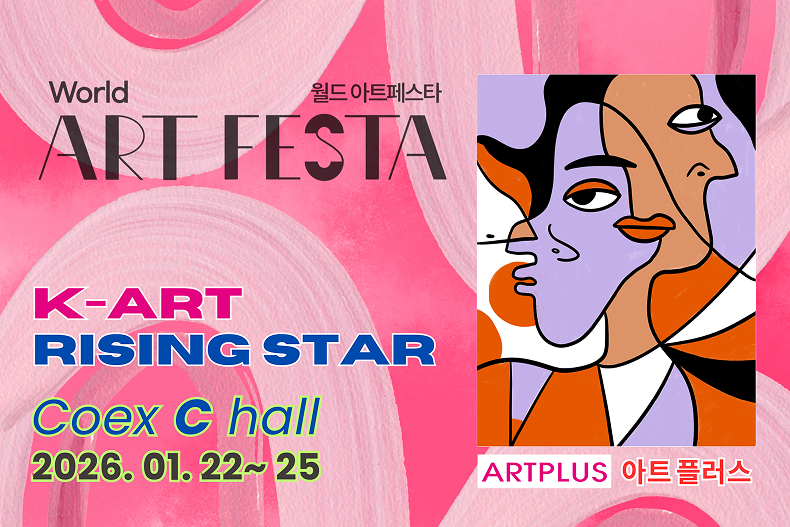문화저널코리아 오형석 기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소멸의 시학: 삭는 미술에 대하여'는 이 오래된 믿음에 정면으로 질문을 던지는 전시다. 미술관의 존재 이유를 떠받쳐온 '불후의 명작'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 작동해온 보존과 수장의 논리를 뒤흔들며, 작품이 스스로 분해되고 사라지는 과정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삭는 미술'을 전면에 내세운다.
전시는 인류의 활동이 지구 환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인류세'라는 시대 인식에서 출발한다. 더 이상 자연을 배경으로 삼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 유지될 수 없는 지금, 미술은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전시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응답으로, 흙·풀·바람·곰팡이·미생물 등 비인간 존재와 공생하며 순환에 참여하는 작품들을 소개한다. 작품은 더 이상 완결된 결과물이 아니라, 생성과 분해가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이 된다.
'삭다'라는 단어가 지닌 이중적 의미는 전시의 핵심을 정확히 짚는다. 썩어 사라진다는 뜻과 함께, 발효되어 맛이 깊어진다는 뜻. 이 전시에 등장하는 작품들은 바로 그 경계에 서 있다. 분해는 곧 소멸이 아니라, 다른 생명과 시간을 불러들이는 조건이 된다.

전시는 '서막'과 1막 '되어가는 시간', '막간', 2막 '함께 만드는 풍경'으로 구성된다. 서막에서 관객은 삭는 미술의 두 가지 축을 마주한다. 이은재의 회화는 갈라지고 바래며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낸다. 회화라는 매체가 지닌 불완전성을 인정하면서도 멈추지 않는 붓질은, 지속한다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태도이자 윤리임을 보여준다. 아사드 라자의 작업은 서울의 폐기물로 만들어진 ‘네오소일’을 통해 공동체의 경험이 축적된 흙을 재생시키고 나눈다. 작품은 물질을 넘어 공동성의 장치로 기능한다.
1막 '되어가는 시간'에서는 변화 그 자체가 작품의 본질이 된다. 이은경의 침식하는 회화는 안료가 지질학적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성하는 물질임을 상기시키고, 세실리아 비쿠냐의 '프레카리오스' 연작은 취약함을 허망함이 아닌 미적 가능성으로 읽어내게 한다. 여다함의 연기 작업, 유코 모리의 썩어가는 과일로 작동하는 사운드 설치는 작품이 살아 움직이며 수행되는 시간임을 체감하게 만든다. 델시 모렐로스와 김방주의 작품이 환기하는 죽음 또한 종착지가 아니라, 삶과 맞닿은 또 하나의 국면으로 제시된다.

서울관 중정에서 펼쳐지는 '막간'은 전시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풀로 만든 고사리의 '초사람'과 흙으로 다져진 김주리의 '물 산'은 계절을 통과하며 형태를 잃는다. 그러나 그 자리에 새싹이 돋는다. 작품은 사라지며 다른 생성을 부른다. 미술관이라는 제도적 공간 한가운데에서 소멸과 생성이 교차하는 장면이다.
2막 '함께 만드는 풍경'에서는 인간의 지위가 근본적으로 재조정된다. 댄 리의 작품에서 천과 항아리, 발효액, 곤충과 곰팡이는 동등한 창작 주체로 작동하며 미술관을 하나의 생태계로 바꾼다. 에드가 칼렐은 고대 마야의 지혜를 소환하며, 가치의 지속과 공유에 대한 또 다른 상상력을 제시한다.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과 미래 재료, 그린레시피랩의 협업은 분해 가능성을 전제로 한 재료 연구를 통해, 국경과 제도를 넘는 실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작품만큼이나 미술관의 역할을 새롭게 묻는다. 분해되는 작품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보존이 불가능한 것을 전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장은 "동시대 환경 인식을 반영한 미술의 변화에 주목하고, 그 변화에 부응하는 급진적인 미술관의 모델을 상상하는 시도"라고 말한다. 이는 미술관이 더 이상 과거를 봉인하는 수장고에 머물 수 없음을 선언하는 말이기도 하다.

배우 봉태규가 재능기부로 참여한 오디오가이드는 전시의 진입 장벽을 낮추며, 복잡한 개념을 관객의 언어로 풀어낸다. 촉지도와 접근성 강화 설계 역시, 포용적 미술관을 향한 실천으로 읽힌다.
한편 '소멸의 시학: 삭는 미술에 대하여'는 단지 '환경'을 주제로 한 전시가 아니다. 이 전시는 예술이 무엇을 남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라질 것인가를 묻는다. 그리고 그 질문은 곧, 인간 이후의 세계에서 미술과 미술관이 어떤 윤리와 태도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로 이어진다. 불후를 포기한 자리에서, 미술은 비로소 다른 존재들과 함께 살아갈 가능성을 획득한다.